꿈에서도 그리던 그 이름, 아버지...

▲월남 때 생이별한 자신의 부친(뒷줄 가운데)과 본당 주임 사제 등 모습이 담긴 1935년 3월께 중화본당 사진을 들어보이며 감회에 젖은 고원익 평양교구 신우회장.
▲1935년 7월께 촬영한 사진(아래). 중화본당 4대(1935. 7~39. 1) 주임으로 사목한 강영걸(왼쪽) 신부와 메리놀외방전교회원 기본스 신부가 앉아 있고, 그 뒤로 본당 어린이들과 남녀 어른들이 함께하고 있다. 네모 점선 안에 중화본당 복사시절 고원익(위 확대한 부분 아래 둥근 점선) 회장과 큰 형 원근(위 둥근 점선, 2001년 선종)씨가 보인다.
60여년 만에 그리운 아버지 얼굴을 사진을 통해 접한 고원익(마티아) 평양교구 신우회장 눈가엔 눈물이 맺힌다. 어느덧 팔순을 눈 앞에 둔 희수(喜壽, 77살), 그 나이에 빛 바랜 사진을 통해서나마 접한 중화본당 유치원 코흘리개 동무들과의 기막힌 만남. 아픔과 설움, 가슴에 맺힌 그리움이 교차한다. 평양교구 설정 80돌을 기념, 평화신문이 기획한 특집연재에서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삭인 가족과 친구들 얼굴을 막 확인한 터였다. 머리카락이 사뭇 희끗히끗해진 고 회장은 1935년 7월께 촬영된 중화본당 공동체 사진(평화신문 1월21일자)을 보자마자 돌아가셨을 아버지, 형, 친구들을 금세 찾아냈다.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절이었지만 사진을 보니 '신앙의 꽃'을 피우던 10대 시절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당시엔 멀리에 사는 공소 신자들도 턱수염에 고드름이 달라붙는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미사를 거르지 않았지요. 북에 두고 온 동무들도 이런 신앙을 아직도 간직하며 살아있을 것입니다."
동강난 한반도. 그 허리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갈려 60성상 신앙의 불을 끄지 않았을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의 눈시울이 이내 붉어진다. 고 회장의 부친 고인덕(인노첸시오, 1896~ ?)옹은 1927년 중화본당 설정 당시 초대회장을 맡아 자신의 집을 공소로 쓰도록 했던 인물. 고옹의 아들 4형제 중 셋은 교회에 대한 공산정권의 박해를 피해 1946년 1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붙잡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월남에 성공했지만 부친과 막내는 북에 남았다.
"형과 같이 중화본당 복사를 할 때 메리놀회 고 신부님이 절대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와 형은 신사참배를 하라는 학교의 지시를 거부하다가 의자를 들고 종일토록 벌을 서고 결국엔 형이 퇴학을 당해 멀리 평양성모보통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고 회장은 당시 중화본당은 사제에 대한 순명과 천주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찬 공동체였다고 회고했다.
"70년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신부님은 어렵기만하고 판공 때 외우는 것이 많아 신부님께 종아리 맞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태중 교우라지만 첫영성체를 하려면 교리공부가 아주 엄격해 주요기도 12단과 요리문답, 주요 성경내용을 외워야 했지요. 너무 길어서 때론 회초리도 맞아가며 교리를 배웠어요."
그러나 그런 순명의식과 투철한 믿음이 고 옹을 비롯한 중화본당 공동체의 신앙을 굳세게 해준 원동력이 됐다.
"요즘엔 꿈만 꾸면 고향 성당과 친구들 모습이 보입니다. 60년전 고향, 그 성당이며 그 자리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50여명이나 되던 평양교구 신우회 형제들이 이제 1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덤으로 살지만 아직도 고향에 갈 꿈을 버리지 않고 삽니다. 실향 1세대들이 죽기 전에 꼭 통일이 돼 성당터를 확인하고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늘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전대식 기자 평화신문 기자 pbc@pbc.co.kr
'[가톨릭과 교리] > 가톨릭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톨릭 교세 성장 '제자리' - 교황청 2007년판 교황연감 발표 (0) | 2007.02.19 |
|---|---|
| 평양교구 설정 80돌 기획 - 의주본당(상) (0) | 2007.02.19 |
| 평양교구 설정 80돌 기획-중화, 관후리본당(하) (0) | 2007.02.19 |
| 평양교구 설정 80돌 기획-중화, 관후리본당(중) (0) | 2007.02.19 |
| 평양교구 설정 80돌 기획- 중화, 관후리본당(상) (0) | 2007.0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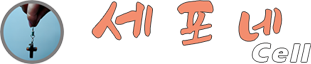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