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 지구를 사막으로 황폐화

◀ 오염된 물 웅덩이에서 깡통을 손에 든 채 놀고 있는 모잠비크의 한 어린이. 사막화는 물 부족과 함께 환경오염, 기후 변화, 질병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 사막화로 인한 모래먼지 폭풍이 수단과 차드 국경지대를 휩쓰는 가운데 차드 오유레 카소니 난민캠프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 니제르 남부 지역 아녀자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나르고 있다. 타는 듯한 가뭄에서 빚어진 사막화로 아프리카 서부 지역은 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CNS 자료 사진
새해는 UN이 선포한 '국제 사막과 사막화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eserts and Desertification)'다. 정확히는 '사막 생태 보존과 사막화 방지의 해'다. UN이 사막과 사막화 개념을 구분한 것은 자연생태환경으로서 사막은 보존하는 동시에 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식물 벌채로 인한 사막화는 막으려 했기 때문.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600만ha(약 186억평)가 사막화되고 있어 인류 생존을 위협할 지경이다. 이에 2006년 새해 특집으로 사막화 원인과 현황, 대안 등을 소개한다.
▶사막화, 왜 계속 심화하나
사막화(Desertification)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함께 환경 오염, 열대림 파괴, 빈곤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돼 있다. 사막화란 기후 변화나 인간 영향으로 건조, 또는 반건조지대로 사막 환경이 확장되는 현상이다. 극심한 가뭄이나 장기간에 걸친 건조화 현상으로 일시적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간에 의한 사막화다. 과도한 식물 벌채, 과도한 경작ㆍ관개, 공업용수 개발 및 노천 채굴 등이 주 원인이다. 사막화는 생명체 유지력을 없애고 지하수면 하강, 흙 표면 및 물의 염류 축적, 지표수 감소, 침식 증가, 토착 식생 멸종으로 이어진다.
사막화는 가뭄이나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남용, 건조 지역으로 확산된 인류에 의해 기후가 영향을 받게 된 지역에서 시작된다. 사막화는 비사막지역뿐 아니라 사막 내에서도 야생 동ㆍ식물이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지역에서도 일어난다. 미국 남서부 소노라 사막과 치와와 사막은 지난 100년간 야생생물과 식물이 감소하면서 눈에 띄게 황폐화했다.
▶사막화, 어디까지 왔나
1963~73년 아프리카 사헬의 10년간 혹독한 가뭄으로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확산돼 20여만명이 사망하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다. 또 1982년부터 85년 사이엔 아프리카에서 수백만명이 사막화 영향에 따른 기근으로 굶어 죽었다.
멀리갈 것도 없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서쪽 60㎞ 지점까지 사막이 육박했다. 타클라마칸과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몽골자치주와 몽골공화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지경이다. 한반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중국ㆍ몽골 등 동북아 사막화는 사회주의 붕괴와 시장경제 도입,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 이에 따른 빈곤문제와 연관이 있다. 연료가 고갈되자 빈곤층에서 마구잡이로 벌목, 땔감으로 팔고 유목민들도 가축이 초지 풀 뿌리까지 먹어버리도록 방치한 결과다. 이로 인해 매년 4월이면,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멀리는 미 하와이까지 '황사'로 뒤덮인다. 또 동일한 기후권에 속하는 동북아의 경우, 사막화는 폭우, 폭설 같은 기상이변까지 불러오고 있다. 북한 또한 전 국토 18%(90년대말 통계)가 불모지로 변하는 등 사막화 초기단계를 밟고 있다.
몽골에서 식림사업과 생태체험사업을 전개 중인 시민정보미디어센터(이사장 손봉호)에 따르면, 몽골은 1990년에 시작된 자본주의 이행 프로그램에 실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무분별한 벌목과 화재로 남한 땅의 7배에 이르는 전 국토의 41.3%가 사막화했으며, 중국 또한 전 국토 30%가 사막화하거나 황무지로 바뀌었다.
사막화로 인한 환경파괴는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1950~60년대엔 연평균 1560㎢에 불과했으나 80년대엔 2100㎢, 2000년대로 접어들어서는 해마다 3400㎢가 사막으로 변했다. 이 결과 전 세계 인구 63억7760만명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5000만명이 사막화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
▶사막화 어떻게 막아야 하나
사막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국제사회는 80년대 이후 사막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구체화돼 1994년 6월17일,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이 체결됐다. 사막화방지협약엔 2003년말 현재 187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1999년 8월15일 156번째로 가입했다.
사막화의 대안은 '식림'밖에 없다는 데 전문가들 의견이 일치한다. 사막화 지대를 중심으로 각국이 협력, 조림사업을 전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환경NGO와 기업이 협력,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70년대를 전후 녹화사업에 들어가 불과 20~30년만에 전 국토를 푸르게 만들어낸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 녹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특히 중국의 사막화 방지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토질 사막화와 석막(바위)화 현상이 심각한 신강성과 감숙성, 내몽골자치주, 영하성, 귀주성 등 5개 지역에 각 지역별로 100만달러 규모로 총 8040ha에 2151만7920그루 묘목을 심었으며 연수생 초청과 한국 조림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조림기술과 경험을 전수한 바 있다. 또 NGO로는 시민정보미디어센터가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정책NGO와 함께 1999년부터 10년간 몽골에 10만그루를 식림하는 사업과 함께 사막화현장 생태현장 투어를 하고 있다. 국내 사막화 방지에 대한 관심도는 이게 고작이다.
하지만 사막화 방지 노력은 지구촌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을 줄이는 첩경이라는 점에서 국제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만 할 '현안 중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미 1971년 교서 「팔십주년」(21항)을 통해 자연환경 파괴는 "전 인류와 관계되는 광범위한 사회문제"라며 "그리스도인은 이제 공동운명이 돼 버린 이 상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임을 나눠져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막화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또 필리핀 가톨릭교회 주교단도 '지구 허파' 노릇을 해온 열대림 파괴와 황폐화를 직시하며 지난 1988년 환경파괴에 대한 사목서한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발표, "환경 파괴는 사회적, 경제적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그로 인한 손상은 광범위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 불행한 영향을 비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면희(프란치스코, 49) 환경정의연구소장 겸 녹색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황사에 중금속 성분이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묻어오니까 관심은 갖지만 국내 현안이 아니라 연계 사안이기에 관심을 덜 갖고 있다"며 "하지만 사막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국경을 넘어 사막화가 진전되는 지역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공동과제"라고 지적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pbc.co.kr 평화신문
'[가톨릭과 교리] > 가톨릭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6 한국교회 전망 (0) | 2006.01.09 |
|---|---|
| 수원교구 통일기원 금강산 송년미사 및 신년미사 (0) | 2006.01.09 |
| 성당서 개인 소지품 주의하세요 (0) | 2006.01.09 |
| 교황 “평화 위협 3대 요인과 맞서라” (0) | 2006.01.09 |
| 교황 베네딕토 16세, 2005년을 마감하며 (0) | 2005.12.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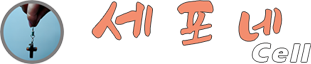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