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교회는] 교무금(상) "
'짐'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 담긴 '봉헌예물'
#1. 김 엘리사벳씨는 주일에 성당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지난해부터 교무금이 벌써 몇 달째 밀려 있기 때문이다.
남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교무금 납부를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니 너무 많이 밀려서 부담스러운 지경이 됐다. 지금 형편으로는 아이들 학비 대기에도 급급해 처음 책정한 교무금을 계속 납부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교무금을 내지 못하는 심적 부담 때문에 영성체도 하지 못하고 성당에 나오는 것이 죄스럽기만 하다.
#2. 장애인 오흥택(베드로)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보조금을 받으면 교무금을 제일 먼저 떼어 놓는다. 한 달 100만 원 남짓한 보조금이 네 식구의 유일한 수입이지만 10분의 1을 꼬박꼬박 본당에 교무금으로 봉헌한다.
오씨의 처지를 잘 아는 본당 사무장이 "꼭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형편에 맞게 교무금을 내면 된다"고 설명했으나, 개신교 신자 시절 습관이 몸에 배어 줄곧 십일조(十一租)를 봉헌하고 있다.
월 3000원의 교무금을 봉헌하는 김 마리아 할머니는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으로 너무 액수가 적다고 느끼는지 본당 사무실에 교무금을 납부하러 올 때마다 미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자식들에게 받는 생활비로는 부족해 종이박스를 줍거나 나물을 뜯어다 팔아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무금이 밀리면 왠지 모르게 찜찜해!"라며 교무금 통장에 가지런히 넣어 둔 3000원을 내민다.
| ▲ 교무금은 교회에 공적으로 봉헌하는 예물로 가톨릭 신자로서 의무이기 이전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봉헌이어야 한다. [백영민 기자 heelen@pbc.co.kr] |
신자 절반 이상 약정조차 하지 않는 현실
개신교 신자들의 철정한 십일조와 대비
신자 의무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 교무금이란?
참으로 민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할 때는 더 그렇다. 늘 살림이 빠듯한 신자들에게 돈 문제를 거론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돈' 이야기, 바로 교무금 문제다.
교무금은 교회의 사목활동과 운영, 유지,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신자 가구마다 매월 일정액을 교회에 봉헌하는 돈을 말한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힘닿는 대로 경제적으로 교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에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222조 1항)고 명시돼 있다.
▨ 낮은 교무금 책정률
문제는 낮은 책정률. 대부분 본당들이 한 해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임에도 40~50%를 밑도는 낮은 교무금 책정률로 고민한다.
P본당의 경우 올해 교무금을 책정한 가구수는 지난 5월 말까지 총 928가구의 활동가구 중 41.7%인 388가구에 불과했고, H본당은 전체 1797가구 중 756가구(42%)다. 대부분 본당에서 교무금 책정률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 또 S본당은 1284가구 중 498가구(38.79%), J본당은 1798가구 중 518가구(28.8%), 또 다른 S본당은 1795가구 중 578가구(32.2%)만 교무금을 책정해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
낮은 교무금 책정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골본당이나 형편이 다소 나은 대도시본당이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절반 이상 신자들이 교무금 납부는커녕 약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교회는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시기에 판공성사와 더불어 교무금을 책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연말이나 돼야 겨우 50%대 책정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본당 사목자들 설명이다.
▨ '10분의 1'이 아니면 '30분의 1'이라도…
교무금의 유래는 구약시대 '십일조'(소득의 십분의 일을 봉헌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십일조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십일조'가 관례화 돼 있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교회는 신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성의껏' 내도록 유도할 뿐 교무금 액수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할 것을 권장한다. 최소한 한 달 중 하루 수입은 하느님께 봉헌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각 본당 교무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그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 Y본당이 주보에 공지한 지난해 교무금 수입은 약 6억2000만 원. 1800여 활동가구 중 1000가구 가량이 교무금을 납부했다. 한 가족이 교무금으로 일 년에 62만 원, 한 달에 약 5만 원을 봉헌한 셈이다.
본당 신자 정 바오로씨는 "한 달 중 하루 수입을 낸다고 해도 30분의 1인데, 우리 신자들은 수입에 비해 교무금을 너무 적게 내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인천 J본당도 마찬가지다. 올해 교무금을 납부하는 518가구 중 429가구(82.8%)가 월 3만 원 이하로 책정했다. 월 10만 원 이상 책정한 가정은 17가구에 불과하다. 즉'30분의 1'이라도 교무금을 봉헌하는 가정이 뜻밖에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2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운동본부가 '한국(개신)교회의 십일조에 대한 이해'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신교 신자의 87%가 '십일조를 봉헌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
▨ 교무금 왜 내지 않는 걸까?
교무금 책정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년도 교무금이 밀려있는 경우. 교무금은 매달 일정액을 정성껏 봉헌하도록 돼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한두 달 밀리다보니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불어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미납 교무금은 전액 완납해야 하기에 매년 교무금을 새로 책정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몇 달씩 밀린 교무금 때문에 고민하는 신자들이 다수 눈에 띈다.
또 많은 신자들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어떻게 교무금을 낼 수 있느냐'고 호소한다. 경제 불황으로 수입이 줄거나 사업이 잘 안 풀려 교무금을 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사업부진과 가장의 실직 등으로 교무금을 낼 수 없었던 신자들이 상당수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교무금 납부가 '신자의 의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무금 납부는 다른 가계 지출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교무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듯 부담으로만 받아들이거나, 후원금이나 기부금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점도 교무금 책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봉헌금액도 낮은 이유다. 책정한 교무금을 낼 수 없어 고민하다 아예 냉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교무금에 대한 이해 부족 탓이다.
실제로 형편이 어려울 때는 본당 신부와 면담을 통해 밀린 교무금이나 책정액을 삭감 또는 면제 받는 방법이 있다. IMF 당시 여러 본당에서 신자들의 교무금을 분할 납입 또는 삭감, 심지어 면제해준 경우가 있다.
교무금이 비록 교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의무지만 교무금을 낼 수 없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게 일선 사목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가톨릭과 교리] > 가톨릭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톨릭학교 관련 법,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0) | 2008.07.20 |
|---|---|
| [바오로의 해] (5)- 첫번 째 전도여행 (0) | 2008.07.20 |
| [바오로의 해](4) 충돌은 있었지만 지향점은 '그리스도' (0) | 2008.07.13 |
| [바오로의 해] (3) 유다인에겐 배교자, 그리스도인은 의혹의 눈길 (0) | 2008.07.13 |
| [연길교구 설정 80돌 기획] 연길 5000km 대장정-대령동,차조구본당 " (0) | 2008.07.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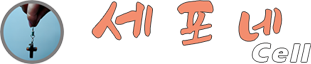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