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친 세 손가락, 삼위일체이신 구세주임을 드러내
<= <1>교황청 성 라우렌시오 경당에 설치돼 있는 작가 미상의 15세기 '동방 박사의 경배'작품.
<2>피터 폴 루벤스. '동방 박사의 경배',1617~18년경. 캔버스 유화 자료 제공=한국교회사연구소
'주님 공현 대축일'은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맞아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바치러 온 삼왕(三王)의 방문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2세기 초반 동방교회에서 유래돼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아', 라틴어로 '에피파니아'라 불렀다. 이 말은 '스스로 드러내심'이라는 뜻이다. 아기 예수가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드러나셨음을 응축하는 말이다.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아 교황청 성 라우렌시오 경당과 프랑스 리용 보자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편의 성화를 통해 주님 공현 대축일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마태오 복음서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찾아왔다(마태 2,1~8 참조). 이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 그리스도를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새 「성경」에 '동방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고이'는 본래 '현자' 또는 '꿈의 해석자'라는 뜻이다.
'동방 박사의 경배' 이야기는 네 복음서 중 유일하게 마태오 복음서에만 나온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이사 60,1-6), 즉 "너의 빛을 보고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그들은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라는 예언이 실현됐음을 선포했다.
서방교회는 제1차 니체아 공의회(325년) 이후 예수 성탄 대축일과 함께 주님 공현 대축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동방교회는 주님 공현 축일을 성탄 축일과 함께 지내고 있으나, 서방교회는 '성탄' 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공현'때 온 민족의 경배를 기념하고 있다.
이 축일은 1월6일에 기념한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처럼 사목적 편의에 따라 1월2~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기도 한다. 서방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날 축제를 동방 박사의 축제로 지낸다. 그래서 구유를 꾸밀 때 성탄 때는 구유의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마리아와 요셉, 목동들과 가축 등만을 배치해 놓았다가 주님 공현 대축일 때가 되면 동방 박사들을 배치해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주님 공현 대축일 관련 성화는 신자들이 본격적으로 성화상을 공경하기 시작한 4세기경부터 그려졌다. 성경에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가 모두 몇 명인지 씌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성화에는 한결같이 3명의 동방 박사만 등장한다. 초세기 교부 오리게네스(185?~254?)가 "예물이 셋이니 동방 박사도 3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은 사물과 시간의 시작과 마침을 가르키는 완전 수이다.
교황청 성 라우렌시오(산 로렌조) 경당 벽면에 걸려 있는 15세기 작가 미상의 '동방 박사의 경배' 성화는 주님 공현 대축일 장면을 재현한 전형적 그림이다. 세로 규격의 그림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때가 깊은 밤이고 또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이 동굴임을 암시하기 위해 배경 전체를 검은 색으로 칠했다. 성모자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이미 경배를 한 목동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동방 박사들이 여장도 풀지 않고 차례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다.
구유 대신 강보에 싸여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아기 예수는 양 손 모두 세 손가락을 펼쳐 자신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 강생한 구세주임을 드러내고 있다.
마태오 복음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 장면에서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성화도 요셉을 등장시키지 않고 있다. 성모 마리아 뒤쪽에는 세 명의 천사들이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쓴 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동방 박사들은 초기 교회 전통에 따라 인생의 세 단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 제일 먼저 유럽을 상징하는 나이 든 가스발이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은 채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바치고 있다. 그 뒤에는 장년인 아시아의 왕 멜키오르와 아프리카의 청년 발타사르가 유향과 몰약을 들고 경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청년의 흑인과 장년의 황인, 노년의 백인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 것은 왕 중 왕이신 예수에게 이 세상 모든 대륙의 전 인류가 영원 무궁토록 경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황금과 유향, 몰약은 '왕권'과 '그리스도의 신성', '인류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각각 상징하는 예물이다. 또 신학자 칼 라너는 황금은 '우리의 사랑'을, 유향은 '우리의 그리움'을, 몰약은 '우리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칼 라너는 동방 박사의 예물이 구세주 아기 예수의 신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 드리는 합당한 우리의 희생, 인간으로서 우리의 자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17세기 화가 피터 폴 루벤스(1577~1640)의 1617년 작품 '동방 박사의 경배'(프랑스 리용 보자르 미술관 소장)는 교황청의 그림과 기본적 형식은 같으나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아기 예수가 성모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있으나 자기 발로 구유 위에 서 있다. 알몸인 아기 예수는 자신의 발에 입을 맞추는 가스발의 머리에 오른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있다. 예수와 마리아는 성스러운 존재로 머리 주변에 성광을 발하고 있다. 벌거숭이 아기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임하신 구세주의 존재를 드러내 주고 있다.
성모 마리아 뒤에는 요셉이 있다. 그는 조금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눈을 동방 박사 일행에게 응시한 채 서 있다. 가정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요셉의 눈에는 값비싼 옷에 진귀한 선물까지 들고 찾아온 이들이 경계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교회 전승에 따라 동방 박사의 신분이 '왕'들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교부 떼르툴리아노(160~223)때문이다. 떼르툴리아노는 "만왕이 다 그 앞에 엎드리고 만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되리라"(시편 72,11)는 시편 말씀과 연관지어 동방 박사를 왕들이라고 간주했다.
동방 박사의 경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은 메시아 출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다. 동방 박사 이야기는 유다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보편적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준다. 주님 공현 대축일 말씀 전례 독서에서 알 수 있듯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구세주의 강생으로 유다인들에게 약속된 복음 선포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교회와 영성] > 성미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예수 신전에 바치심 (0) | 2006.01.15 |
|---|---|
| 양에 대한 경배 (0) | 2006.01.15 |
| 성탄-그렉치오의 구유.동굴 벽화 (0) | 2005.12.25 |
| 동방박사의 경배 (0) | 2005.12.06 |
| 아기 예수의 탄생 (0) | 2005.12.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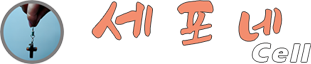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