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독일 유학시절에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희한한 구경거리`를 만난듯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당시 독일에는 한국인은커녕 동양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 어느 기차역에서. |
1956년 10월, 배움의 열망을 가슴에 안고 독일에 도착했다.
뮌스터대학 요셉 회프너 교수신부님 밑에서 '그리스도 사회학'을 배운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사상에 기초한 인간관과 국가관 등을 정립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사람이 그 분이다.
그런 이론적 토대가 허술했더라면 70~80년대의 그 험난한 시기를 제대로 헤쳐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 전에 독일 의원들이 그분의 학문 업적을 기리는 모임을 열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다. 참으로 훌륭하고 저명한 학자신부님이셨다.
회프너 교수님은 일본 상지대학 은사인 게페르트 신부님 소개로 만났다. 게페르트 신부님은 언젠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독일로 가거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게페르트 신부님은 당시 서강대학교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와 계셨다. 유학 문제에 대해 상의할 겸 신부님을 찾아뵈었다.
"요셉 회프너 교수를 찾아가서 배워라. 난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가 교수인지 신부인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그의 저서를 읽어보니까 사회학 이론이 매우 깊고 건전하다."
게페르트 신부님은 손수 추천서까지 써주셨다. 벨기에로 계획했던 유학길이 독일로 바뀐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은 유럽 대륙에 유학생이 많이 나가 있어 덜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동양인 유학생의 고충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뮌스터에 가기 전에 퀼른에서 두달간 머물렀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바람에 무척 곤혹스러웠다. 한국인은 고사하고 얼굴색이 노란 동양인을 처음 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버스에 오르면 어떤 사람은 화들짝 놀라기까지 했다. 그때 퀼른시 전체에 한국인은 두세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음식은 그나마 입에 맞았다. '품뽀니끄'라는 검은 보리빵과 돼지고기를 구워 말려서 얇게 썰은 '신뽀니'라는 게 특히 먹을 만했다. 그러나 '한국 토종'인데 김치와 된장국이 왜 그립지 않겠는가. 수녀원에서 방 한칸을 얻어 살고 있을 때, 비가 내려 날씨가 음산한 날이면 김이 모락모락나는 밥과 된장국 생각이 간절했지만 독일 저녁식사는 대부분 찬음식이었다.
그런 날 학교에서 세미나까지 마치고 늦게 돌아오면 식탁에 차려놓은 저녁을 먹는둥 마는둥하다 내 방에 가서 캠핑용 버너에 불을 붙여 밥을 짓곤 했다. 반찬이라고는 조선간장 비슷한 '막'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양파를 썰어넣어 만든 양념간장이 고작이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쌀밥에 '막'을 붓고, 그 위에 생계란을 풀어 쑥쑥 비벼먹는 하숙방 저녁식사….
그동안 여러 자리에 초대받아 온갖 음식을 다 맛보았지만 그 시절 한 손으로 책장을 넘겨가면서 떠먹은 밥 보다 더 맛있는 밥은 먹어 본 기억이 없다. 내 평생 내 손으로 밥을 지은 기억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출타하고 안 계서서 형과 함께 밥을 해먹은 것과 학병시절에 중대 취사병으로 근무할 때, 그리고 독일 하숙생 시절이 전부이다.
독일어가 서툴러서 어느 수녀님한테 야단(?)을 맞은 적도 있다. 수녀원 아침미사를 집전하기로 하고 오전 7시30분에 자명종 시계를 맞춰놓고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에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다. 누군가 싶어 나가봤더니 수녀님이 잔뜩 화가 나서 "왜 6시반 미사에 나타나질 않느냐"고 따졌다. 6시반? 독일어는 6시반을 '반7시(할프 지벤 halb sieben)'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그 바람에 미사시각도 못 지키는 게으른 신부가 돼버렸다.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외국생활이란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고 새삼 깨달았다. 그제서야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교사 신부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나 헤아릴 것 같았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전공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사회학'은 신학부에 속해 있어서 교의신학·윤리신학·교회법·성서 등 신학과 성서 전반을 다시 새롭게 공부해야 했다. 특히 한국에서 성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배워가면서 신구약 성서를 익히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도교수님은 내게 '한국 가족제도'를 연구하고, 그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권유했다. 문제는 그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있는 자료는 순전히 한문으로 되어 있고, 영어와 불어자료는 조금 있지만 독어자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한국 가족제도는 유교 전통이 깊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면 유교 경전도 독해할 줄 알아야 했다. 그러려면 내 한문 실력 갖고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아쉬운대로 불어자료라도 참고하려면 새로 불어를 배워야 했다. 이 때문에 머리에서 쥐가 날 지경이었다.
결국 지도교수님께 찾아가 "이 주제로는 도저히 논문을 못쓸 것 같으니 바꿔달라"며 백기(白旗)를 들었지만 교수님은 요지부동이었다. 지도교수님은 원래 어느 학생에게든지 출신국 가족제도를 연구하라고 주문하는 분이었다.
그래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재미만큼은 쏠쏠했다. 초기에는 강의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강의내용이 서서히 귀에 들어오자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만 같았다. 신학교 시절에 배운 것보다 훨씬 앞선 내용을 접할 때는 '한국은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했다.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는 수없이 많지만 배우는 기쁨도 어느 것에 뒤지지 않는다.
한창 공부 재미에 빠져 있던 그 즈음에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유학생활 3년째로 접어들었을 때이다. 대구교구 서정길 주교님이 독일교회 초청을 받아 오시는데 비행기에서 덜컥 감기에 걸려 경유지 파리에서 심한 고열에 시달리셨다. 독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폐렴으로 악화된 상태였다.
그 바람에 서 주교님은 독일 시립결핵요양원에서 넉달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비서역할을 해야 했다. 한국교회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오지리(오스트리아) 부인회도 서 주교님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서 주교님을 다시 빈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여러달 동안 병수발을 들었다. 다행히 주교님은 2년후 쾌차해 귀국하셨다. 중간에 다른 신부가 와서 교대를 해주기도 했지만 꼬박 2년 동안 공부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주교님을 모신 셈이다.
주교님이 떠나신 후 다시 뮌스터대학 교정으로 돌아왔다.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려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그러나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할 팔자(?)는 아니었나보다.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전화와 편지가 오기 시작했다.
'[교회와 영성] > 추기경 김수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톨릭시보사 사장 시절 (0) | 2009.05.04 |
|---|---|
| 독일 유학생 시절(下) (0) | 2009.05.04 |
| 교장신부 시절과 1950년대 후반 한국교회 (0) | 2009.05.04 |
| 내 무릎에 기대어 눈을 감으신 어머니 (0) | 2009.05.04 |
| 짧았던 교구장 비서 시절 (0) | 2009.0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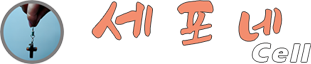




댓글